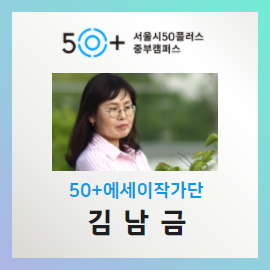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설계한 안토니오 가우디는 ‘자연은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책과 같다’라고 말했다. 가우디는 기술을 이용해 몬세라트 지형을 그대로 인간 세계로 옮겨오려는 강한 열망을 가슴에 품고 일생을 바쳤다. 그의 모든 영감의 원천은 자연이었다. 인간은 끊임없이 창조를 꿈꾸지만 단지 발견만 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창조주가 만든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사람의 독창성은 자연으로 돌아갈 때 나온다고 믿었다.
자연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면 자연으로 나가 관찰해야 한다. 이사 갈 집을 수리하면서 자연 따위는 잊고, 인터넷 바다에 넘치는 이미지를 검색하며 정신이 산란했다. 하루하루 처리해야 하는 과제(?)에 매진했더니 글 한 줄도 못 읽고, 쓰는 일은 엄두도 못 냈다. 진짜(?) 삶은 읽고 쓰는 일 바깥에 있다고 다독였다. 사는 것은 눈앞에 불어닥친 일에 시간을 저당 잡히는 일이고, 굴러떨어지는 시시포스의 바위를 끊임없이 다시 굴려 올리는 일이 아닐까.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질 걸 알더라도 말이다. 시시포스의 바위가 굴러떨어져도 잠시 내버려 두기로 하고 안면도로 떠났다.

안면도는 조류가 만든 마법을 보여주었고, ‘만물은 살아 있다’는 것을 환기하는 전시장이었다. 드르니항에서 출발해서 꽃지해변까지 이어지는 길은 순둥순둥하고, 곳곳에서 생명 에너지가 발산되었다. 뭍과 물이 빠진 갯벌은 경계가 사라졌다. 뭍이자 갯벌인 곳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뭍에서 볼 때는 곧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수평선은 들어갈수록 자꾸 도망가는 것 같았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수평선이 끝없이 이어졌다.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가까이 보이는 파도에 다가가려고 걷고 또 걸었다. 하지만 파도는 가까이 갈수록 멀어져 신기루 같았다. 뒤를 돌아보니 뭍이 아득하게 보였다. 새털구름이 떠 있는 드넓은 하늘과 갯벌이 맞닿아 폭을 가늠할 수 없이 광활한 캔버스 같았다.

갯벌 위를 걸으며 발아래서 작은 생명의 흔적을 발견했다. 물이 물러난 덕분에 생명의 순환을 맨눈으로 볼 수 있었다. 물기를 머금은 모래 위에 조개가 이동한 흔적이 길게 나 있었다. 작은 게들은 고개를 숙이고 찾아야 보이는 작은 구멍을 뚫어 모래 아래 집을 만들었다. 집의 현관으로 사용하는 구멍 주변에 모래 구슬이 쌓였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멜로디 같아 걷던 사람을 초대했다. 먹이를 찾는 갈매기들이 한두 마리씩 날아들었다. 갈매기를 눈으로 좇으니 오랫동안 쓰지 않아 퇴화한 시각이 서서히 예민해졌다. 갈매기의 고개가 움직이는 곳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눈을 가늘게 뜨고 갈매기가 낸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썼다. 갯벌 전체에 생명의 숨결이 스며있었다.

생물이 살아 있다고 내보내는 신호는 사람을 손짓해 불렀다. 갯벌 위를 걷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생물들의 집인 모래를 헤집고, 조개를 캐고 게를 잡았다. 사람들은 생물에게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었지만, 작은 생물을 손에 든 사람들은 기꺼이 수렵채집 시대의 후예가 되었다. 잃어버렸던 아이 같은 천진한 미소를 되찾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순수한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금세 두 손 가득 조개를 잡았다. 입 꾹 다문 조개를 바닷물에 담그고 몇 번 헹구었다. 조개는 반짝반짝 빛이 났다. 조개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부터 조개의 종류까지 이야기 잔치를 벌였지만, 잡은 조개를 바다에 다시 놓아주고 꽃지해변으로 걸음을 옮겼다. 해가 넘어가려면 두어 시간이 남았지만, 겹겹이 하늘을 가린 구름 속으로 해가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꽃지해변의 유명인사 할미바위와 할배바위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썰물 때 들어갔던 사람들의 다리 위로 물이 서서히 차올랐다. 구름 속에 비치는 희미한 붉은 빛 노을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알려주었다. 안면도로 오면서 내버려 둔 바위를 다시 굴려 올릴 이유를 찾을 시간이었다.
50+에세이작가단 김남금(nemon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