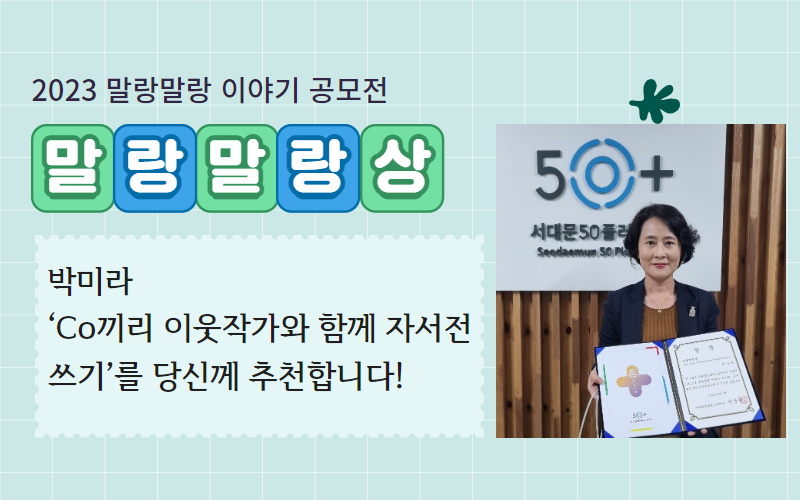육교 건너편으로 서대문50플러스센터가 보인다. 육교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문을 열고 층계참으로 발을 디디는 순간 ‘신발에 껌이라도 붙었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내 다리가 이렇게 무거웠나?’ 하며 또 한 번 시도해 보지만 여전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층계를 오를 수가 없다. 거기에 더해 이번에는 다리까지 후들거리기 시작한다. 곧이어 심장까지 쿵쾅대면서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이유는 글을 한 번도 제대로 써 보지 못했던 내가 자서전인가 뭔가 하는 것을 쓴다며 겁도 없이 ‘Co끼리 이웃작가와 함께 자서전 쓰기’ 수업에 덜컥 신청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이 바로 첫째 날이다. 2층까지의 계단이 마치 108계단만큼이나 길게 느껴진다. 이대로 몸을 돌려 도망치고 싶다.
그렇게 나의 ‘자서전 쓰기’ 수업은 시작되었다. 첫날 우리는 서로 데면데면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고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강사이신 김순옥, 박종국 작가님이 들려주시는 꾸밈없고 진솔한 이야기와 아이들처럼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여러 활동을 통해 비로소 마음을 열었다. 둘째 날부터는 어릴 적 동네 친구라도 만난 것처럼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는 두 달 만에 많이 친해졌다. 친구의 친밀도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공유한 이야기의 양에 비례하는 것 같다. 우리는 사실 서로의 어린 시절 속에 존재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치 그 공간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울고 웃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많은 작가들이 책을 통해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 ‘글쓰기’는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수단이라고 말이다. ‘Co끼리 이웃작가와 함께 자서전 쓰기’ 수업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기만 했는데 듣는 이들의 눈에서 치유의 빛이 나와 나를 감싸 안는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이다. 정말 그랬다. 그들은 이야기 들어 주러 나온 아르바이트 학생처럼 내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빛냈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이 된 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소중하고 멋진 것이었다. 물론 나도 그들의 이야기에 똑같이 반응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곳에 있으면 자연스레 그렇게 된다.
그 신비한 힘의 원천은 강사이신 김순옥, 박종국 작가님에게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분들도 5년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수강생이었지만 이런 소중한 시간을 거쳐 신선(?)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유명한 강사님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분들이라 더욱 우리 이야기를 꺼내 보일 수 있었다. 그분들은 우리가 서랍에 감추고 싶었던, 우리 자신도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도 끄집어냈다. 우리의 책상 서랍이 그 분들에 의해 뒤져졌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기뻤다. 인생의 반을 훌쩍 넘긴 지금 책상 서랍을 정리할 때가 되었던 것이다. 서랍 정리를 모두 마친 우리는 마침내 ‘나의 책’을 한 권씩 받아 안았다. 갓 태어난 아이를 간호사로부터 넘겨받아 품에 안았을 때처럼 떨리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간호사 역할은 독립출판사 (주)이분의일코리아가 해 주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직원들이 수고와 격려로 헌신해 주었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곁엔 언제나 든든한 서대문50플러스센터가 있었다.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쭉 있을 것이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가 있었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고 알리고 싶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너를 위해 준비했어! 서대문50플러스센터.’